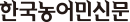김현희 / 청년농부·전북 순창
[한국농어민신문]

꽁꽁 얼어붙어있는 발에 오줌을 누면 잠시는 따뜻해지지만 그 이후에는 더 차갑게 얼어붙는다. 잠시 동안은 효력이 있는 듯해도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인 행동을 이르는 속담인 ‘언발에 오줌누기’는 농촌에서 진행된 빈집 정비 사업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속담이다. 8년 전 순창에 처음 내려와 귀농귀촌지원센터 일을 할 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일할수록 순창에 귀농 여건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곤 했다.
시골에 방치되어있는 마을의 빈집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2000여만원 정도를 들여 고치고는 4~5년간 귀농인에게 싼 값이나 무상으로 빌려준다. ‘귀농인의 집’이나 ‘행복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각 지자체마다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지원사업을 우리는 열심히 활용했다. 당장 교육을 마치고 내려오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집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사업이 최선이었다.
6주간의 장기교육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1년짜리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 했고, 그때 이 정책은 좋은 해결방안이 되어 주었다. 정책 덕분에 다양한 시골집을 고치고 정비해 청년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귀농인이 본인의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졌다. 당장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의 형편없는 시골 빈집도 지원사업을 통해 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멀끔하게 고칠 수 있게 되니 수요도 없던 빈집의 가치가 올라갔다. 도시에 있는 자식들은 더욱더 빈집을 내놓지 않게 되었다. 지원사업으로 고친 집은 한사람 당 1년에서 길어야 5년까지만 살 수 있었고, 빈집 사업을 통해 순창에 내려와 살던 사람들은 그 이후엔 점점 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과거 6주간의 장기교육 기간에 이전 기수 선배들이 찾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앞 기수의 청년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나오지 않는 빈집과 땅을 두고서요.’ 이 말에 학생들 뿐 아니라 나도 충격을 받았다.
선배들은 교육을 마친 후 귀농인의 집을 통해 순창에서 살 수 있는 1년이란 시간은 얻었지만, 그 시간동안 원하는 집과 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같은 형편의 사람들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계속 생기는 상황이니 마음을 다해 환영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드는 이유는, 당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교육을 받고 빈집정비 사업을 받아 지역에 정착했던 언니들이 이제는 기간이 지나 하나 둘 집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어서다. 이 문제는 나에게도 적용되는 일이다.
우선 마음이 달라진 것도 있다. 처음 귀농 했을 때는 임대 빈집이라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잘 고치고 살 마음이 있었는데, 8년차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는 내 집이 아니라면 임대 빈집에는 조건이 좋아도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매매를 찾아봐도 주변에서는 모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받아 고치고 싶다는 집만 있지 팔겠다는 집이 없으니 참 답답하다. 과거에는 사업을 받을 빈집을 찾기 위해 헤맸는데 지금은 신청하려는 집주인들이 연초부터 몰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결국 언니들과 나의 선택지는 공공임대아파트다. 올해 나는 신청 후 선정까지 최대 4~5개월이 걸리는 임대아파트 2곳에 신청서를 냈다. 시골살이의 끝이 아파트라니. 서울에서도 못살아봤던 아파트 생활을 이곳 순창까지 와서 한다는 게 씁쓸하기 그지없다.
여전히 시골에는 한집 걸러 한집은 방치된 빈집이고 마을은 텅텅 비어간다. 이럼에도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살 곳을 얻지 못해 떠난다면 근본적인 정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가뜩이나 빈집 많은 시골에 나까지 새집을 짓겠다고 환경파괴하고 싶지는 않고, 언젠가는 작고 소박한 빈집이 나와서 예쁘게 고쳐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