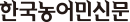김현희 청년농부·전북 순창
[한국농어민신문]

최근에 1984년에 제작된 ‘수리세’라는 다큐멘터리를 볼 기회가 있었다. 전남 구례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수세 현물 납부투쟁을 다룬 내용으로 나의 농사 선생님께서 그 이후 일어났던 수세 거부 운동의 주역이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봤다.
다큐멘터리의 초입에는 당시 농업현장을 다룬 신문 기사들을 화면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걸 보며 좀 놀랐다. ‘우울한 사과대풍 오히려 서럽다’, ‘중간상만 배불린 양파농사’, ‘미국쌀 50만톤 들어온다’, ‘벼 수매가 요지부동’, ‘농가 빚 심각하다’ 등 최근 기사 제목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다.
여기에 ‘농촌에 젊은이가 없다’, ‘인구는 줄고, 빈집은 늘고, 젊은 층 뺏긴 농촌’ 등 지금도 계속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부족 문제 역시 당시부터도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오늘날 보기 힘든 기사 제목은 농약중독을 다룬 내용 정도였다. 1984년 농촌의 문제로 꼽혔던 것들이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생각하니 참 씁쓸했다.
특히 인구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모두 인구소멸위험에 처해있는 인구감소지역이다. 순창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8만명이 살았는데, 올해는 2만6000명이 살고 있다. 2016년 순창에 올 때만 해도 인구가 3만명 언저리여서 3만을 지키자가 내부 구호처럼 쓰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한다고 하고, 이 외에도 지역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도입한다고 한다. 구멍난 독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은 대체 무엇일까? 수없이 많이 고민해 봐도 딱히 이거다 하는 확실한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계속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줄 사업들을 찾고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각 지역마다 소득 보전에 대한 부분이나 일자리, 창업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그러다보면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공 인프라 구축이나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 정책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들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저런 정책을 다 제쳐두고 제일 우선해야하는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고민인 것 같다. 도시처럼 집값이나, 학군, 주변 상권이 자부심이 될 수는 없으니, 농촌이라서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도시의 인프라와 자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일하는 경험을 가져보고, 이를 개인의 성취감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얼레벌레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나는 친환경 농업으로 버는 수익은 정말 미미하지만, 자연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있어 계속 지역에 남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이처럼 지역에서 본인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도전하고, 또 성취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농촌지역을 인식하고 만들어간다면, 10년 뒤에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이 농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