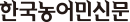김현희 청년농부·전북 순창
[한국농어민신문]

더운 여름, 로망과도 같았던 태모시 만들기를 해보았다. 잘 자란 모시풀을 베어다가 잎을 날리고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칼로 겉껍질을 흩어내니 초록초록 한 모시줄기가 나왔다. 이 연둣빛의 태모시를 햇볕에 널면 서서히 색이 바래서 하얗게 된다다. 품질로 따지면 한산의 농부님들이 만드신 태모시를 따라갈 수 없겠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내손으로 직접 만들고 나니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접 내 밭에 옮겨 심은 모시는 5월의 가뭄에 제대로 크지 못했지만, 여기저기서 오래전부터 방치된 모시풀을 베어가라고 알려주셔서 작업을 해볼 수 있었다.
그냥 잡초처럼 취급하는 풀들도 사람의 손길이 지나고 나면 다양한 쓰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런 신분상승의 최고봉은 바로 밭의 골칫거리 잡초로 손가락질 받는 명아주가 아닌가 싶다. 키 크고 대가 굵게 자라는 명아주는 밭 여기저기 자라나는데, 그 기세가 사뭇 맹렬하다. 예초기를 돌릴 때 마치 나무를 베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심해야 하는 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명아주는 단단하고 가벼워 잘만 가공하면 훌륭한 지팡이가 된다. 그것도 통일신라 때부터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왕이 하사하던 귀한 청려장이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때는 80세가 넘으면 임금님이 직접 청려장을 하사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노인의 날에 100세가 넘은 분들을 대상으로 청와대에서 청려장을 준다고 한다. 과거 80세가 오늘날의 100세인 셈이다.
밭에 넘쳐나는 게 명아주인지라 주변에 호기심 가득한 내 주변사람들도 청려장을 만들어보고 싶어 밭에서 큰 명아주대를 베지 않고 남겼다가 가을에 수확해보았다는 이야기를 종종했다. 다만 수확해놓고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냥 걸어 말렸더니 곰팡이가 슬어 버렸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 그래서 순창에서 명아주 지팡이를 만드는 할아버지를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나의 명아주 선생님이신 김필용 할아버지는 지역신문을 통해 먼저 알게 되었다. 매년 명아주 지팡이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증하신다는 훈훈한 기사를 통해서였다. 아흔이 훌쩍 넘으신 우리 선생님은 마을에서 두 번째 고령자이시지만, 본인의 계좌번호를 외우고 계실만큼 정정하시다. 봄이 오기 전 선생님을 찾아뵙고 올해 명아주 지팡이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자주자주 가서 기르는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하는 일이 많아 중간 중간 자라는 모습만 보고 있다. 명아주는 뿌리 부분이 지팡이 손잡이가 되는데, 잡기 편하게 구부러져 있는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아주가 어릴 때 빈 깡통 같은 것을 매달아 천천히 굽게 했다가 풀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뿌리 부분이 휘어있는 명아주를 얻을 수 있다.
여름이 와서 쑥쑥 자라기 시작하면 적당한 크기에서 위의 생장점을 쳐내고 아래 잎들도 따내준다. 그러면 작은 나무 같은 형태가 되는데, 명아주 대가 밀도 있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다. 선생님은 밭에도 본격적으로 명아주를 심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밭가에 난 명아주도 괜찮게 자란 것이 있으면 허락받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기르시고 계셨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마을의 논가, 밭가에서 선생님이 모양 잡아 기르는 중인 명아주가 눈에 들어왔다.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는데 모시풀처럼 수확한 직후에 껍질을 벗기고 삶는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선생님이 만드시는 하얗고 단단하고 가벼운 청려장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작년에 만드신 청려장을 빗자루대로 사용해 빗자루를 만들어 보았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다양한 쓰임을 찾다 보면 더 다양한 세대로부터 사랑받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잡초라고 미워하던 명아주를 예쁘게 보듬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