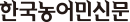김현희 청년농부·전북 순창
[한국농어민신문]

작년 연말, 홍천에서 온 선생님께 모시풀을 이용한 빗자루 만들기 수업을 배우며 나는 또 다시 빗자루 공예라는 새로운 영역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전까지 열심히 해왔던 죽공예가 소홀해진 상황에 벌어진 일이었다. 완성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는 죽공예는 수일에 걸쳐 재료를 준비하다보면 만들려고 했던 처음의 의욕이 사그라지기도 하고, 바쁠 땐 아예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서서히 대나무를 손에서 놓기 시작할 때 빗자루 만들기를 배웠다.
모시빗자루는 한 번 잡으면 2~3시간 뒤에는 완성품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죽공예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즉각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농사와 일에 치여 에너지가 바닥인 나에게는 절실한 부분이다. 섬세함보다는 힘으로 승부하는 나의 성향과도 잘 맞았다. 저녁마다 틈틈이 만들다보니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가락 마디사이가 터졌다가 아물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이제는 제법 만드는데 자신이 붙었고 나의 로망 중 하나였던 거친 손 만들기의 위업도 함께 달성할 수 있었다. 지금은 완성한 빗자루를 지역 장터에 팔기도 하고,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모시빗자루에 사용되는 모시는 한산의 모시농가에서 가공한 태모시를 구입한 것이다. 태모시는 쐐기풀과에 속하는 모시풀의 속껍질을 벗겨 1차 가공한 것으로, 이 태모시를 이로 물어서 가늘게 째고 무릎에 비벼 얇은 실로 만들면 굿모시가 된다. 이 굿모시를 날실 씨실로 엮어서 베틀에 올려두고 짜야지만 모시천이 만들어진다. 옷감을 만드는 귀한 직물이기 때문에 댕강댕강 잘라서 빗자루를 만들기에는 사실 아깝고 과분한 소재다.
이 귀한 모시풀을 구입해서만 쓰는 게 너무 아쉬웠고, 태모시까지 만드는 과정은 농가에서도 하고 있는 듯 해 직접 해보고 싶었다. 주변에 모시를 기르는 분들이 있는지 수소문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선생님이 계셨다. 같이 영농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의 어머님이신 한복순 선생님께서 모시를 길러 옷까지 만들어봤다는 것이다. 그날로 약속을 잡아 선생님을 찾아갔다.
정읍에서 시집을 온 선생님은 모시뿐 아니라 삼베, 목화, 누에를 이용한 옷감 만들기를 모두 섭렵한 기술자셨다. 처음 순창으로 시집와 시부모님과 한집 살이 하며 저녁마다 민망하고 심심했는데, 마침 근처의 부자 집에서 모시천 제작 의뢰를 받아 저녁이 더 이상 심심하지 않게 됐다. 당시에는 모시 재료를 부잣집에서 대면 다 만든 완성품은 반반씩 나눠가지는 것이 통상적이라 옷감을 얻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어느 날 만들던 모시천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힘든 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남편이 부잣집에 가서 이런 일 안 받는다고 선포하고는 만들던 것도 다 던져 주고 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어찌나 속상해하시던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모시 천을 만들지 않았고 집에 있던 모시칼을 비롯한 베틀과 각종 도구들도 자연스럽게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나 시집올 때 받아온 모시풀만은 아직도 마당에 남아 지금도 매해 맛있는 모시떡을 해서 드시고 계셨다. 이 귀한 모시 뿌리를 어머니께 많이 얻어다 밭에 심었다. 속껍질을 벗기고 가공하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서, 수확하면 태모시로 가공하는 법도 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내 밭에는 2~3종류의 빗자루용 수수와 댑싸리, 모시가 열심히 자라고 있다. 선생님께 잘 배워서 내손으로 직접 태모시를 만들고, 이걸로 작게나마 직조도 해보려고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주변에 이런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모시를 통해 선생님을 알게 되고, 선생님의 삶 역시 함께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올해 배운 것, 들은 것들을 잘 기록하고 남겨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