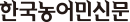임영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농어민신문]
정부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육성 선언
작지만 의미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서막
남을 이, 들어올 이 고려 균형 갖춰야

농촌비즈니스(rural business)란 무엇인가? 형태로만 보면 종이컵, 페트병, 스마트농업 등과 같은 한국어와 영어의 혼종어(混種語)이다. 의미로 본다면, 농촌에서 특정 목적(특히 경제적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체계·조직적으로 행하는 경영(사업)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다지 흔하고 익숙한 용어는 아니다. 이러한 생소한 용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백약이 무효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농촌정책에 있어 농촌비즈니스가 유효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농촌비즈니스라 함은 농업(생산)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귀농과 귀촌이 구분되듯, 농업비즈니스와 농촌비즈니스도 동의어는 아니다.
선진적인 농촌정책, 농촌발전모델로 관심받는 EU의 공동농업정책 내 농촌개발프로그램(RDP)에서는 농촌비즈니스가 중요한 보편적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농촌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지역경제활동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EU의 농촌비즈니스는 농업기반, 비농업기반, 혼합(융복합) 모두를 아우른다.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 농촌사회 못지않게 농촌경제, 즉 농촌비즈니스의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대부터 농촌비즈니스(農村ビジネス)를 공식적인 정책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농업과 직접적 연관성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농산물·자연·문화·인적자원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가치순환을 창출하는 사업활동으로 확장하여 접근한다. 일본의 농촌비즈니스도 EU와 유사하게 농촌을 터전으로 한 다분야 혁신 비즈니스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역자원(산림, 공예, 식문화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나가노현의 영리법인(주식회사) 지역자원활용연구소(株式会社地域資源活用研究所), 지역 온천을 기반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시카와현의 야마시로온천 마을만들기 주식회사(株式会社まちづくり山代温泉), 지역 해변(모래사장)을 기반으로 관광·체험형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치현의 비영리법인 사하마미술관(NPO 砂浜美術館) 등은 농촌비즈니스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교부금)을 받은 비농업형 농촌비즈니스 사례들이다.
반면에 한국은 어떠한가? 농촌소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기존 농촌정책의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농촌비즈니스에 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식과 사고는 담겨있지 않다. 또한 비즈니스 관점이라 해도 농업 및 농식품과의 이별에 소극적이다. 농업 및 농식품 창업·벤처·비즈니스는 익숙해도 농촌 창업·벤처·비즈니스는 어색하다. 지역발전 또는 지역혁신 분야에는 ‘Being in the air(공기 중에 있다)’, ‘Local buzz(지역의 웅성거림)’란 수사적 표현이 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기술·아이디어·교류·행위가 지역 내에 존재해야 지역발전과 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농업·농식품 연관성이 적더라도 농촌지역에 착근되고 어우러지는 다차원, 다분야 비즈니스를 농촌비즈니스로 인정하는 EU, 일본의 접근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한국에도 유사한 개념과 정책적 움직임은 존재한다. 다만 농촌형 창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사업, 6차 산업화 등 에두른 표현들이 대부분이고, 농업·농식품과의 연관성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그러나 고무적이게도,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임팩트업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IMPACT-UP)’를 개최하면서, 농업 위주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작지만 의미있는 서막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조금 아쉬운 대목은 아직도 농촌비즈니스가 아닌 농촌형(農村型) 비즈니스라는 점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르면 되는데 말이다. 농촌비즈니스를 공식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구체적 개념·범위·대상·지원수단 등을 정교화하면 될 일이다. 농업경영체가 있듯이 농촌경영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필요를 느꼈으니 앞으로 답을 찾아가면 된다. 분명한 사실은 향후 농촌정책, 농촌발전모델의 전개에 있어 농촌비즈니스의 정책적 공식화(정체성), 농촌비즈니스에 대한 폭넓은 사고 확장(유연성), 농촌비즈니스를 위한 외부 인재·기술·자원의 유입 촉진(개방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정책은 남은 이만을 위함이 아닌 남을 이, 들어올 이를 위한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 농촌비즈니스는 유용한 대안이다. 작지만 의미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서막을 알린 현 정부의 농촌정책에는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