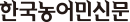김현희 청년농부·전북 순창
[한국농어민신문]

낭만을 가지고 내려온 시골 살이는 어느덧 치열한 생존의 장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더 즐거운 일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요즘은 주말마다 마을에서 짚풀 공예를 배우고 있다. 겨울 농한기 때 하려고 한 게 코로나로 미뤄지면서 가장 바쁠 시기에도 모임은 이어지는 중이다. 공통된 주제의 이야깃거리가 없어 만나도 대면 대면했던 마을 어르신들과 저녁마다 새끼를 꼬면서 이야기꽃을 피운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양씨할아버지는 아흔이 넘은 나이임에도 짚풀 공예를 알려주실 땐 눈이 반짝 거리신다. 지금은 짚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수업 때마다 점점 만드는 신발의 모양이 좋아지고 있다.
양씨할아버지는 앉은자리에서 두 시간이면 짚신을 한 켤레 만들어 내신다. 자기 발 모양에 맞춰서 만들 수 있고 바닥면에는 짚이 두툼하게 들어가 당장 신고 다녀도 멋질 것 같은 신발이다. 이런 짚신을 양씨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나이 때부터 만드셨다. 당시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했는데 학생들에게 표를 10장씩 나눠주고 실수로 한국말을 하면 한 장씩 뺐었다고 한다. 10장 모두 뺐기고 나면 짚신을 한 켤레 만들어서 학교에 내야만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선생님은 머슴일을 하면서 밤마다 새끼를 꼬고, 짚신을 만들어 신어오셨다. 짚신을 잘 만들어도 머슴일이 고되어 이틀이면 짚신이 다 헤져서 다시 만들어 신어야 했고, 밤마다 방에서 새끼를 꼬고 신발을 만들어 신으셨다. 40~50년 전 일인데도 그때의 손기술은 어디 가지 않고 선생님의 손과 머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기술이 어디 신발뿐일까. 망태기, 자루, 멍석, 소 신발과 입마개 등 짚풀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는 우리 선생님. 짚풀 수업이 아니었으면 나는 우리 마을에 이런 기술자가 계셨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다.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은 입버릇처럼 볏짚이 좋아야한다는 말을 하신다. 오늘날 농촌에서 주로 기르는 개량벼들은 모두 하나같이 키가 작다. 자연히 볏짚도 짧아 물건을 만들기엔 알맞지 않다. 과거에 기르는 벼들은 키가 큰 종류들이 많았다. 일상에서 워낙 볏짚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벼가 많이 열리지 않더라도 볏짚 활용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벼 품종을 일부로 기르기도 했었다고 한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집마다 기르던 품종들이 있었는데, 당시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강제로 못 짓게 됐다고 한다. 당시 모판에 모를 기르면 농촌지도사가 다니면서 통일벼가 아닌 모판은 발로 뒤집고 밟고 그러고 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으로서는 선뜻 상상이 안 되는 잔인한 풍경이다.
다행이 내 주변에는 토종벼를 열심히 심고 가꾸는 씨앗모임 언니들이 있다. 언니들에게 키가 큰 토종볏짚을 얻어 공예에 사용하고 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볏짚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는 아예 언니들에게 구입해서 쓸 생각이다.
죽공예도 그렇고 주변에서 기르고 가꾸는 풀과 나무로 만드는 공예에 관심이 많다. 직접 기르거나 채집해서 만들고, 그 쓰임을 다한 후엔 자연스럽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예를 하고 싶다. 나에게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면 좀 더 한 가지 기술에 깊이 매진할 것 같은데, 넓고 얇음을 추구하는 내 소양으로는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다. 그래서 순창에 내려와 내가 만나게 된, 혹은 아직도 찾아 헤매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겨볼까 한다.
의식주를 공장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른 것으로 직접 만들어서 영위하는 삶. 한 60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많이들 그렇게 살았다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마치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 하나가 신기하고 재미있다. 허투루 듣지 않고 잘 남겨두면 또 다른 누군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마을을 기웃거려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