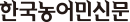안재은
[한국농어민신문]

늦은 오후 시장에 가니 상인들이 나물과 오곡 쌀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집 저집 똑같은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어서 무슨 날인가 하고 달력을 봤더니 벌써 보름, 정월대보름이다.
농촌에 살지 않았다면 정월대보름은 나물 먹고 호두 먹는 날인줄 알고 그냥 지나갔을 거다. 하지만 농촌에 살고부터는 정월대보름은 준비부터 예사롭지 않다. 우리민족의 명절인 추석과 설이 있다면 농촌의 명절은 정월대보름이다. 가족과의 명절을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농촌에도 명절이 찾아왔다.
처음 마동리의 정월대보름을 봤을 때 참 이색적이었다. 마치 다른 나라 축제에 참여한 것 같았다. 부녀회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대책회의에 들어간다. 마을 예산은 얼마나 남았으며, 누가 시장에서 돼지 머리고기를 사올지, 나물은 누구네 집에서 하자 등 많은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 많은 논의 중 “올해도 귀밝이술 많이 담아 놨죠?”라는 질문도 오간다. ‘귀밝이술’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는데, 그걸 사 먹지도 않고 직접 해서 먹는다는 게 나에게는 경이로운 상황이었다. 그것도 90세나 되신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이처럼 정월대보름은 나한테 설날 이상의 명절로 다가왔다.
행사 전날에는 할아버지들이 모여 북은 누가 치고 꽹과리는 누가 칠 거며, 징은 누가 치는지 상의한다.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북을 못 들겠소. 내일은 김 씨가 혀” 오랜 기간 북을 잡던 사람도 바뀌고, 동선도 맞춰보는 중대한 시간이다.
드디어 정월대보름, 행사 날이 다가왔다. 며칠 전부터 마을회관 문 앞과 제사를 지낼 돌탑에 새끼줄이 처져 있다. 저 멀리서 할아버지들이 꽹과리와 북, 징을 치면 어르신들은 집 밖으로 나와 두세 군데를 돌며 조상님께 절을 올린다. 마지막에는 돌탑으로 가서 돼지머리에 절을 하며 덕담을 나눈다.
“올해도 농사 잘되고 우리 마을 별 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마을의 큰 어른이 소원을 빌고 절을 올리면 모두가 개인의 소원을 빌며 절을 하고 종이를 태운다. 나도 조상님께 큰절을 올리며 종이를 태웠다. 처음 겪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공동체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도 나를 그 공동체의 한 명으로 인정해주었다.
오후에는 삶은 돼지 머리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정월대보름을 처음 겪었다고 이야기하니 오히려 어르신들이 나를 신기하게 보셨다. 그러면서 옛날 마을의 보름도 회상하셨다. “나 어릴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떡을 많이 먹지도 못했어. 줄 서서 기다려야 겨우 떡을 받아먹었어.” 70세가 다 되어가는 어르신은 줄 서 있는 아이의 얼굴을 하며 옛날이야기를 꺼내셨다.
“한 때 우리 마을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어. 여기엔 학교도 있어서 애들도 많았지. 학교 앞에서 장사도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다 죽고 없지.”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는 마을에서 정월대보름 같은 농촌의 명절을 몇 년 뒤엔 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정월대보름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마을에서 어르신 두 분이 돌아가셨고, 치매가 심해지거나 몸이 쇠약해져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들도 생겼다.
그러나 올 정월대보름에는 마을이 다시 분주해 지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고, 모처럼 마을에 활기도 넘친다. 예전만큼 분주한 정월대보름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