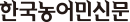안재은
[한국농어민신문]

나는 이제야 농사를 4번 지어봤다. 2018년 봄. 서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나는 팀장님과 계약연장을 오랫동안 상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청주로 돌아가서 내 평생 전혀 안 해봤던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회사에서 농부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청년 농부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급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다. 팀장님한테 찾아가 퇴사를 선언했다. 그리고는 농사를 짓고 싶은 명확한 계획을 이야기 했더니 바로 응원을 받았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찾은 정부 정책의 흐름이 청년들을 농촌에 유입하고 있다는 것과 스마트팜을 할 거라는 계획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 마치 제안서를 쓰듯이 퇴사를 선택한 배경과 과업을 이야기해서인지 계약 연장을 원하던 모든 팀원들이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었다.
시골에 연고도 없고, 농사 경험도 없는 나는 내가 계획한 스마트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잘 몰랐다. 처음에는 독일 직업전문학교에 농업 관련과가 있다고 해서 유학을 가려고 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이장님을 찾아가 농사를 배우겠다고 했다. 나는 이장님 자두농장에서 열매 솎는 것부터 나무 전지까지 3년을 쉬지 않고 배웠다.
오로지 내 힘으로 농사짓는 게 목표였던 터라 자두농장이 쉬는 날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교통비도 받지 않고 품앗이를 하러 돌아다녔다. 가까운 동네 복숭아밭에서 산 속 오미자 밭까지, 겨울에는 배를 타고 제주에 가서 한 달 동안 당근 수확을 돕기도 했다.
전국을 다니며 터득한 경험으로 내 농사를 지어보려고 2019년에는 땅을 빌려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 사실 자유롭게 여기 저기 다니며 농사를 배워볼까 했지만 주변에 농업 정책을 눈여겨보시던 어른들은 빨리 땅을 알아보라고 도와주셨다. 2019년 드디어 나는 내 힘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300평밖에 안되는 밭에서 들깨랑 서리태를 심었다. 계곡에서 물을 길러서 약을 쳤고, 약통을 짊어져서 어깨에 항상 멍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망을 뚫고 고라니가 들어와서 다 먹는 바람에 서리태 농사는 반타작밖에 못했다. 다음 해에도 문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반타작도 못하는 모습을 보신 한 할머니는 비탈진 밭 800평을 넘겨주셨다. 여기서 더운 여름날 들깨를 심느라 탈진을 하기도 했었다.
2021년에는 드디어 내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청년 후계농 지원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된 600평의 땅을 구했다. 그리고 올해는 체리 밭 인수 제안이 들어와서 체리농장도 시작하게 됐다. 농사를 지으려면 내 땅이 있어야한다는 말에 뒤도 안돌아보고 다 내 것으로 만드려고만 했다. 그리고 그게 농촌에서는 인정받는 일이라 땅 넓히는 일에 집중해 왔던 것 같다. 하지만 ‘대출 이자 납입 도래’라는 문자를 보자마자 현실을 직시하고 말았다.
시간은 내가 수익을 내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나는 빚을 빨리 갚기 위해 현실의 눈을 빨리 떠야했다. 농사로 수익을 내는 기간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수익이 되는 농사를 위해 자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자본이 많을수록 준비하는 시간은 짧아진다. 그 와중에 정부의 청년농업인에 관한 정책이 바뀌어서 대출 상환기간은 10년 거치 20년 상환, 1.5% 이자로 바뀌었다. 나를 비롯해 이전 정책의 수혜를 받았던 청년농업인들은 좀 더 현실성 있게 바뀐 정책을 오로지 부러워하고만 있다.
농사 이제야 4번해봤다. 내가 평생을 농사지어도 50번 이상하기가 힘든데 이 짧은 우여곡절 속에서 내가 우여곡절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날이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