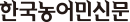안재은
[한국농어민신문]

얼마 전에 제주에 ‘자파리 농부’라는 행사를 다녀왔다. 자파리라는 말은 표준어로 ‘장난’이라는 말인데 작은 평수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청년농부들이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불리고 있는 별칭이다. '소꿉장난처럼 농사짓는다'는 말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지 않다. 제주나 육지나 청년농부들의 새로운 활동들이 지역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양이다.
제주 자파리 농부들의 모임에는 정말 다양한 자파리들이 모였다. 토종 씨앗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할머니들만 졸졸 따라다니는 농부도 있고, 작은 농지에서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비건 요리 클래스를 여는 농부, 200평 남짓 작게 시작했지만 어느덧 큰 농지 규모를 운영하면서 농업을 인문학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농부 공동체까지. 이들은 모두 지역 어르신들한테는 장난처럼 농사짓는 친구들이다.
육지에서 ‘떡국이’로 불리는 나는 별명이 하나 더 있다. “농사짓는다면서 맨날 건달처럼 돌아다니기만 혀” 청주에서 농사짓는 우리는 '건달'이다. 어른들의 농업방식은 농지에 계속 붙어있으면서 작물을 관리하고 수확량을 늘려 공판장에서 가격을 잘 받고 판매하면 착실한 농부다. 하지만 우리는 건달이면서 내 농지에만 붙어있지 않고, 이곳저곳 다른 집 농지에서 행사를 기획하면서 농산물 판매 이외의 일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도 농지에만 붙어서 마음 편히 농사짓는 농부를 꿈꾸고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촌의 열악한 실태를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하고, 농촌 체험도 기획하고, 농촌의 가치를 기획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만의 농업방식이 생겼다. 그 농업방식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걸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몇억 주고 땅을 사서 시설투자도 해야 하고, 가뭄이나 태풍으로 농사도 망해봐야 하고. 우리는 농지에 있는 작물은 망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농촌살이는 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반농반x’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자파리 농부에 참여하고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도 청년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건달 농부’ 그냥 들으면 부정적인 의미로 비칠 수 있어서 새롭게 뜻을 만들어봤다. 세울 건(建), 달성할 달(達) ‘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고, 슬기로운 농촌살이의 목적을 달성하는 농부’. 우리가 항상 듣던 ‘건달’이라는 말을 우리만의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다.
주민들의 마당에서 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마을주민 여러분과 타지역 청년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제주 자파리 농부가 멀리서 와서 자신만의 농업방식을 이야기한 덕분에 주민들이 청년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다. 나는 그동안 왜 어른들은 우리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이해를 못할까 의문을 가졌지만 이렇게 청년의 이야기를 정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처음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건달 농부’ 청년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우리도 마을 주민들과 상생할 기회를 얻는 시간이었다.
제주도에서 자파리 농부로 시작된 행사는 청주에서 건달 농부가 되었고,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무주에 ‘무작정 농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국에 모든 건달 농부들이 자신만의 농업방식을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인 각자의 마을에서도 인정받고, 더 큰 날개를 펼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