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은
[한국농어민신문]

귀농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한테 기대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기계도 없고, 돈도 없는 '맨땅에 헤딩' 중인 청년이기 때문이다. 내가 농사짓는 이곳은 나에게 연고가 하나도 없는 곳이지만, 다행히도 나는 청주 토박이라는 이유 하나로 여기저기 잘 어울릴 수 있었다.
표준어에 가까운 말씨를 쓰던 나는 어느덧 귀농 4년차에 할머니 할아버지 말씨와 말투를 닮아가고 있다. 동네 할머니 집에서 밥을 얻어먹을 때면 할머니는 메인 셰프가 되고, 나는 보조 셰프가 되는데 할머니가 “저븜(젓가락) 좀 가져와”라고 말하면 나는 곧 “할무니, 저븜 빼다지(서랍)에 있슈?”라고 답하곤 한다.
농촌은 공동체 빼면 시체인 곳이다. 예부터 품앗이, 두레 등으로 기계 없이 농사를 도와왔고, 지금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공동체가 굴러가고 있다. 노인 인구만 있는 마동리는 나 같은 청년이 꼭 필요한 곳이다. 내가 어르신들한테 기계와 농업 기술 그리고 연륜을 빌리듯이 어르신들은 청년들의 힘과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를 빌린다. 농사를 시작할 때 밭을 갈고, 땅을 다지는 일은 기계가 다 한다. 내 밭에 무너진 둑을 보수하느라 이장님이 굴삭기로 일을 해주셨고, 마을 젊은이 70대 초반의 아저씨가 돌 쌓는 기술을 알려줘서 둑을 보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을의 ‘찐 젊은이’ 30대 초반인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봄철이면 나의 일도 바빠진다. 봄에 농협에서 구입한 비료는 마을단위로 분배가 되는데 이때 청년이 빠질 수 없다. 마을회관 앞에서 20kg 비료를 할아버지 경운기에 싣고, 밭에 내리는 일을 반복한다. 할아버지는 “여자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녀”라고 하지만, 20kg 비료를 손쉽게 드는 나의 모습에 놀라시며 곧 나에게 비료 나르는 일을 믿음직스럽게 맡기시곤 한다. 하루 종일 20가구에 비료를 나르고 나면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전을 부쳐온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 없었으면 큰 일 날 뻔했네. 늙은이들이 어떻게 이걸 다 옮겨.” 나는 으쓱해하며 막걸리와 끊임없이 나오는 전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스며들곤 한다.
그렇게 어느 순간 동네 이장보다 더 젊은 나를 찾아주는 어르신들이 많아졌다. 마당에 물이 안 나올 때도 전화가 오고, 가스불이 안 켜진다고 전화가 온다. TV가 안 나온다고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냉장고 A/S 기사와 소통해달라고 타지의 어르신 자제들도 연락이 온다. 잠이 많은 청년이기 때문에 가끔은 새벽에 일찍 전화가 울리면 귀찮기도 하지만 전화를 받아보면 “밥 많이 했어. 아침 먹으러 와”, “밭에 뭐 심어야지 같이 햐”와 같은 내용이라서 안 받으면 큰 손해다.
이런 공동체가 요즘에는 아쉬울 때가 많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봄이 되면 밭 정리를 해놓고 꽃구경을 하러 가시는데 꽃구경하러 간지도 오래되었고, 생일잔치를 하려고 모인지도 오래되었다.
얼마 전 휴대폰 사진첩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직전, 마을에서 탑제를 지내면서 잔치를 하는 영상을 봤다. 정월대보름에는 항상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머리 잡아다가 삶고, 떡을 해서 먹고, 산골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사 놓고 윷놀이로 상품을 드렸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윷을 던지는 모습, 1등을 했다면서 상품인 바가지를 머리에 얹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니 옛 모습이 많이 그립다.
코로나로 디지털이 확대되고, 메타버스로 근무하는 요즘이지만, 이곳 마동리처럼 고령화된 동네는 디지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코로나 전의 일상을 그리워하며 집밖을 나가지 못하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공동체가 달라지고 있다. 어쩌면 청년들이 코로나 시대에서 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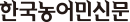
그 일들에 더한 청년들이 더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