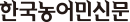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한국농어민신문]
기후위기 시대 학교텃밭의 가치는 그런 일상으로 지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사는 꼴을 경험할 수 있다. 7가지 감자를 통해 다양성이 곧 지속가능성임을 배운다. 왜 생물종의 다양성이 필요한지 왜 사라져가고 있는지를 감자를 통해 배운다.
ㅣ 배이슬 전북 진안

감자가 풍년이다. 거름과 비료를 한 밭에서는 감자 하나가 1kg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감자가 풍년이 된 것은 때 맞춰 조곤조곤 비가 온 덕이다. 반면 논감자(겉은 보라색에 눈이 많고 길쭉한 재래감자)는 학교도, 인근 지역의 농부도 씨앗만 겨우 건졌다고 한다. 게을러 풀 한복판에서 기른 내 밭은 논감자가 실하고 수미는 작았다.
작년에는 내내 가물어 수미나 두백 같은 개량종 감자가 영 부실했지만 울릉도 홍감자, 논감자, 자주감자는 바글바글 들었었다. 작년과 올해 뒤바뀐 감자생산량은 점점 더 국지적으로 변하고 있는 기후 때문이다.
비가 내리 오는 날들,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고 타박하게 되는 더위,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가 때려 붓는 곳과 비 한 방울이 귀한 곳이 나뉜다. 그러니 어딘가에서 연구 결과가 이렇다느니, 시베리아가 불타고 있다느니 같은 이야기 너머로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이미 매일 기후변화 한복판에서 조바심 내고 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 환경은 지금과 다를 것이기에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지금은 우리의 문제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미래의 환경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인 대안의 실천 즉, 지금 나의 삶의 전환 없이는 또 다른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 학교 텃밭은 ‘일상’으로 연결된 직접적인 대안의 실천이다. 농업기술을 가르치거나 노동의 고됨을 미리 일러주기 위한 게 아니다. 상추 한 잎, 토마토 한 알을 통해 다른 생명과의 연결을 직접 경험한다. 경험을 통해 일상으로 연결되는 즐거움, 신비함, 풍요로움을 만난다.
학교 텃밭 시간이 되면 1/3은 텃밭 작물들에 관심을 두지만 2/3는 지렁이와 흙장난에 더 관심을 가진다. 상추한포기 심다가도 ‘어?! 개구리다!!!’ 하는 순간 ‘어디? 어디? 무슨 개구리야?!’ 하고 상추는 관심 밖이 되곤 한다.
학교텃밭 활동 자체가 잃어버린 40년의 지혜를 연결하고 일깨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성공과 실패라는 틀을 씌운다면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학교텃밭에서 가득 자란 작물로 배불리 먹는 것, 아이들이 노동의 관점으로 농업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학교 텃밭의 성공일까? 벌레와의 전쟁, 잡초와의 전쟁으로 여름방학이 지나면 정글이 되어있는,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도 수확하지 못한 텃밭은 실패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텃밭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한들 나의 생명이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내가 심은 상추 한포기와 달팽이, 개구리와 뱀 그렇게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텃밭에서의 실패가 아닐까.
올 해 학교텃밭에는 약 7가지 감자를 심었다. 학교텃밭 별로 땅심, 볕들기 등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같이 크기가 작은 감자는 적고, 논감자는 많이 들지 않았다. 감자꽃을 지킨 덕에 방울토마토 같은 감자열매도 적잖게 열렸다. 내년에는 씨감자가 아닌 감자 씨앗으로도 감자를 심을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의 텃밭기록에도 분홍, 빨강, 보라, 흰색의 다양한 감자 그림들이 등장한다. 7가지 감자를 심고 기르고 지키고 수확하고 먹어본 아이들에게 감자는 하얗다, 수미감자가 대명사처럼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감자를 만나면 ‘무슨 감자에요?’ ‘어디에서 자랐을까?’ ‘어떻게 자랐을까?’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기후위기는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오늘 나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다. 기후위기 시대 학교텃밭의 가치는 그런 일상으로 지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사는 꼴을 경험할 수 있다. 7가지 감자를 통해 다양성이 곧 지속가능성임을 배운다. 왜 생물종의 다양성이 필요한지 왜 사라져가고 있는지를 감자를 통해 배운다.
한 두가지 감자만 심었다면 어느 해는 감자를 먹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 다른 감자를 심은 덕에 쓰임에 맞게 잘 먹는 것으로, 다름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게 된다.
사실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시대를 떠나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먹는 것이 곧 나임을. 머리가 아닌 경험으로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알아야 할 일이다. 잠시 그 연결을 잊고 살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