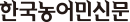배이슬·전북 진안
[한국농어민신문]

동네 할머니께서 질은 밭에 감자를 놓기 위해 흙을 갈았다. 뭐만 하려면 비가 온다며 볼멘소리로 말씀하신다. 비가 와 질어진 밭을 일구면 딱딱해져서 돌덩이처럼 되지만 하는 수 없다. 감자심기에 때가 늦은 것도 있지만 ‘남의 일’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어렵고 농사를 놓자니 평생을 해온 일을 놓을 수 없다. 코로나로 농업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규모가 큰 농가는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인건비가 소폭 올랐다. 남의 일이라 봤자 하루 날품팔이지만 할머니들은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으니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농사를 중심으로 농촌에 필요한 크고 작은 역할을 나누어 이른바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다.
지난 겨울 꿈꾸는 농업을, 농촌에서의 삶을 열심히 적어 냈던 두 친구가 각각 지원사업에서 떨어졌다. 청창농과 후계농업인지원사업에서 최종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두 친구와 함께 망연자실해야 했다. 면접이 끝나고 어땠는지 물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 묻지 않았다’고 답한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지 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던데, 그렇게 농사지으면 돈 못 버는 건 알지요?!’ 하고 확인하더란다.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투자하는 대신에 적정규모로 지속가능한 농적인 삶을 그리던 두 친구의 꿈은 정부가 지향하는 농업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을까.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청년들에게 농업, 농촌이라는 선택을 장려한다고 만들어진 제도지만 다른 가치와 규모를 꿈꾸는 청년들은 농업인의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일까.
농업인이라는 증명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부터 인정된다. 직불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사업에서 경영체 정보는 필수제출서류가 되었다. 농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크고 작은 지원들을 챙겨 받으려면 수시로 서류를 처리해야 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오셨지만, 경영주 변경이 어려워 신규등록을 하자 한 지역에서 농사지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크고 작은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농업인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 외에 다른 일을 해서 살면 농업인이 아닐까? 경영주는 겸업할 수 있다는데, 공동경영주 등록이 어려운 농가 구성원은 농사일만 하거나 불안정한 일만 해야 하는 걸까?
매년 규모와 수익을 늘리는 농사를 짓지 못하면 바람직한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일까? 규모화를 꿈꾸고 지원사업을 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하다보면 빚에 쫓기기 일쑤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더 크고 효율적인 농기계를 앞 다퉈 사야하고 그렇게 농기계 위에서 12시간씩 살아내는 농업인 친구들도 많다. 빚이 빚을 늘려나간다.
국가지원을 받는 데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치우쳐있다. 농사를 짓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다름이 가지는 풍요로움이다. 한 가지 작물만 심으면 서로 경쟁하고 약하게 자란다. 반면 작물을 섞어지으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자란다. 콩밭에 수수, 감자밭에 강낭콩처럼.
할머니는 흰감자를 심을 때 한 켠에 눈이 많은 보라색 논감자를 심었단다. 흰감자가 들기 전 논감자는 땅속에서 먼저 차기 시작하고 감자 북을 주며 땅속에 풋것인 논감자를 따다 먹었다. 그래서 꼭 일부를 씨감자로 두었다가 함께 심었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성은 농업이라는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큰 규모로 단일작물을 기르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작은 밭 한 켠에 수 십가지를 기르며 살아간다. 규모와 방식만으로 농업인을 규정하기보다 농업생태계를 유지할 다양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