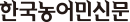배이슬·전북 진안
[한국농어민신문]

이제나저제나 비가 오려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하루걸러 하루 연일 비가 내린다. 간사한 마음에 이제는 비가 좀 띄엄띄엄 오기를 바란다. 이제는 사계절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뉘고 있나 보다 말한다.
때를 맞춰 심은 콩이 연일 내리는 비에 녹아 싹을 틔우지 못했다. 또 때맞춰 심은 감자는 한창 자라야 할 동안에는 가뭄 속에 있었고, 영글어야 할 때는 빗속에 있다. 올해 감자는 예년보다 늦게 심었다.
늦게 심은 13종의 감자들은 한창 물이 필요한 시기에 비를 만났다. 흰색, 연분홍색, 짙은 보라색 각각의 꽃을 피운다. 다들 감자를 캐는 때인데 내 밭은 이제야 감자가 들고 있다.
긴 가뭄 뒤에 쏟아져 내리는 비가 반복되니 밭의 두둑은 더 높이고 유기물을 덮는다. 아주 옅게라도 낙엽과 왕겨를 덮은 두둑은 긴 가뭄에도 흙 속이 제법 촉촉했다. 달라지는 기후에서 할 수 있는 대비는 밭마다 작은 기후를 만드는 일이다.
유독 가물었던 해에는 수미감자가 들지 않았지만, 논감자를 비롯한 토종 감자들은 많이 들었다. 자주 비가 내린 해에는 논감자는 드는 량이 적었지만 수미와 두백 같은 개량종 감자가 잘 들었었다.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기어이 벼 4종, 감자 13종, 고추 3종을 섞어 짓는 이유다.
다양성이 더욱 중요한 때가 온 것이다. 다양한 작물을 기르면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들이 줄어든다. 동시에 다양한 품종을 심으면 예기치 못한 기후에도 거둘 것이 있다. 지속 가능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다양성은 이제 선택을 넘어 필수에 가깝다.
자연이 부려주는 마법에 숟가락을 얹어 얻어먹는 게 농부의 일이다. 농사를 짓는 일은 귀 기울여 그들이 말해주는 때를 아는 것이다. 그들은 들릴 듯 말 듯 소곤거릴 때가 많다. 그러니 눈과 귀, 코와 손끝을 총동원해 듣고 느껴야 한다.
듬성듬성 산에 붉은 산벚나무가 피면 볍씨를 모판에 부어야 할 때다. 그 산의 색, 그 산벚나무의 색에 따라서도 올해 물을 어찌 준비해야 할지 가늠한다. 들판에 조팝나무가 피면 모내기를 하는 때가 되었다. 충분히 흙이 데워지는 때 오동나무 꽃이 연보라색 꽃을 피운다. 그 어느 작물이든 밭에 잘 자리 잡을 시간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진달래, 개나리, 조팝나무, 산수유, 목련이 함께 피었다. 밭에 나던 엉겅퀴들은 산 중턱으로 올라가 피었다. 귀청 떨어지게 빽! 소리쳐 말해준다. 들의 풀이, 논의 개구리가, 산에 핀 꽃들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보고 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할 줄 알던 그 일이 이제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지구 온난화다. 기후위기다.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 계속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거대한 담론 혹은 나와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계속된 가뭄과 지금 내리는 비가 나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는 일이다. 꽃들이 소리 지르듯 피어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는 일이다. 한쪽에서 가뭄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일이 나의 일임을 아는 것이다. 사회 도덕적 연대가 아니라 나의 삶이 지속하지 못할 위기를 인식하는 일이다.
번개가 치는 밤, 빗속을 걸어 논물을 본다. 번쩍이는 밤의 들판에서 덜덜 떨며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다. 그렇게 밤낮 돌아보지 않으면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알아간다. 어쩌면 기후위기는 스스로 만드는 밥 한 숟가락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