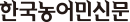배이슬·전북 진안
[한국농어민신문]

올 해는 책상에서 짓는 농사가 길어져 가지·고추·토마토 씨앗 넣는 일이 조금 늦었다. 겨우내 어느 밭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을지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씨앗을 심어 기르는 육묘다. 자가채종 한 토종씨앗부터 모종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몇몇 작물들 때문에라도 직접 모종을 기른다. 할머니는 ‘고추모종은 갓난아기 다루듯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볕이 세면 타거나 마르고 적으면 웃자란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도 병이 들거나 고꾸라지기 일쑤이고 낮아도 몽땅 죽어 한해 농사를 그르칠 수 있다.
비닐하우스가 없던 시절에는 가장 늦게 오는 서리 전에 밭에 직접 씨앗을 심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가지·고추·토마토는 늦게 심는 만큼 적게 달렸다. 이어져 내려온 씨앗들은 그래서 흙에 바로 심었을 때 지주해 줄 것도 없이 잘 달리고 병도 적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많은 양을 따기는 어렵다. 번거롭지만 꼭 육묘를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한 번에 밭에 심어두면 솎아내는 등 씨앗의 양이 적을 때는 허실이 많다. 또한 심긴 밭 전체를 일찍부터 관리해야 하니 힘이 많이 든다.
처음 농사를 지을 때 하우스 안에 작은 묘상을 만들어 씨를 넣을 때면 의심 없이 검정색이나 갈색의 플라스틱 포트에 심었다. 오래된 모판에 올리면 딱 맞는데다 작물마다 필요한 크기로 맞춰진 50구·72구·128구의 검정색 플라스틱 포트에 씨앗을 넣었다.
한 해 두해 씨앗을 넣다보면 잘 갈무리 해두었어도 한해만 지나면 우두둑 부스러지기에 십상이었다. 진안의 만상일인 5월 7일을 지나보면 동네마다 가득 버려진 플라스틱 포트를 주워와 썼다. 그마저도 쓰레기의 양만 늘어나고 밭에는 부서진 검정색 플라스틱만 나왔다.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없이 모종을 기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 도구와 방법으로 모종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해오시던 데로 포트 없이 직접 심어 기르는 땅모, 신문지를 접거나 말아 심는 신문지 포트, 휴지심을 모아 접어 심거나 우유팩에 심는 방법, 계란껍질에 심거나 계란판에도 심어보았다. 국내외 시중에 나온 종이포트나 압축포트, 플라스틱 포트도 써보았다. 최근에는 흙을 배합해 반죽해서 심는 소일블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유기농, 생태농업 등 농업 안에서는 자연과의 순환이 연결고리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왔다. 제로웨이스트, 쓰레기 없는 소비에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하지 못하는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든 생각은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적다. 검색만 해보아도 같은 플라스틱 포트 중에서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구성이 갖춰져 다양하게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그 선택지부터가 많지 않다. 더구나 줄어드는 인력만큼 기계의존도가 높다보니 모종을 사서 심게 된다. 두 번째 노동력·비용·작물 생육 면에서 기존의 플라스틱 포트만큼 편하고 힘이 덜 드는 도구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양을 키워낼 때는 기존의 제품 안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더 대안을 찾고 싶다. 어느 농부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심을 수 있다면 좋겠다. 지속가능한 삶은 지속가능한 먹을거리로부터 시작되고, 그 시작에 씨앗이 있다. 씨앗과 함께 순환가능한 육묘를 선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와 전쟁으로부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시끄러운 세상에 경칩이 온다. 개구리가 입 열 듯 농부는 때가 되었으니 씨앗을 심는다. 그것으로 입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