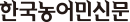배이슬·전북 진안
[한국농어민신문]

진안 청년들과 두 번째 영화를 찍었다. 재작년 용담댐 수몰 이야기를 그린 ‘사진사’에 이어 도시 청년 여성의 농촌살이 이야기를 담은 ‘낯선’이라는 영화다.
‘낯선’은 농촌에서의 청년 여성이 겪게 되는 작은 에피소드들을 다뤘다. 평상시 잘 입던 옷도 주변의 시선과 말 때문에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일이나 시외버스도 아닌데 하루에 몇 안 되는 교통편에 벌어지는 일들, 친절한 마음을 알지만 불편하고 두려운 관심 등을 말이다. 영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들은 모두 서로 낯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것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방식이, 존재가 낯설어 일어나는 일들이다.
농촌에서 점점 일상적으로 구체화한다는 이름으로 서로를 가르는 표현이 늘어난다. 새로 온 이와 살던 이로, 노인과 청년으로 구분 짓는다. 더 자세하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눈다. 때로는 이런 관점이 ‘우리는 모두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한다.
예를 들어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군에 ‘노인정이 몇 개인데 청년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거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이야기할 때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같은 말들 말이다. 당연하게 모두에게 필요한 일들인데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가르고 더 가져와야 하는 다른 상대로만 이야기하게 된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지만 농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관계 맺기로 시작해 관계 맺기로 끝난다. 가까이에는 가족과 주변의 이웃으로 시작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매 순간 들여다보지 않으면 연결되기보다 고립되기 쉽다.
밭에 심은 작물 하나가 주변의 식물과 관계 맺고, 뿌리내린 흙과 서로를 돌보는 농부와 주변의 생물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관계 맺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때로는 경쟁하듯 보이더라도 함께 뿌리내린 곳을 이롭게 하려고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되 뿌리가 연결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산에서 놀 때나 밤과 버찌를 따 먹는다며 남의 집 마당을 넘나들 때도 지역 어른들은 우리의 안전과 돌봄에 마음을 쓰며 행동했다. 나의 아이가 아니어도 으레 마을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들여다보았다. 주변에 함께 사는 이의 삶이 결국 나와 긴밀하게 연결된 일로 생각되는 문화였다. 이렇다 할 시스템 없이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는 방식, 긴밀하게 관계 맺고 살았던 문화였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눈이 소복이 쌓인 때가 오면 마을 여자들이 서로의 집에 돌아가며 모여 놀았다고 했다. 메주도 띄웠고, 김장도 했겠다. 한겨울, 그날들만큼은 서로 술도 담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몇 날 며칠을 속 편히 만났다. 어느 집에 가면 그 집 아저씨가 술안주를 만들어 주고, 어느 집에서는 장구를 잡고 장단을 쳐주기도 했단다.
그 겨울 집마다 다니며 논 것은 단순히 잘 노는 일을 넘어 한해를 살아오며 속상했던 일들을 풀어내는 일이었다. 마을 대소사를 모두 함께 치르며 마음 다쳤을 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웃고 떠들며 서로의 속엣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때 나눈 이야기들로 다음 해 함께 일하면서는 그 사람의 색깔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신경 쓰기도 했다. 긴밀한 관계는 그 긴 시간을 쌓아 만들어졌다. 그런 문화 그대로 마을 사람들은 청년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지만, 지역살이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마을과 지역사회도 기존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청년들이 낯설고 불편하다. 가시가 돋친 밤송이 안에 매끈한 알밤이 들었듯이 서로를 찌르는 말과 방식처럼 느껴질 때 그 속에 뽀얀 알밤을 서로 드러내 보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