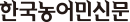배이슬·전북 진안
[한국농어민신문]

작년에 이어 조금 이른 때 서리가 내렸다. 고구마와 토란이 하룻밤 사이 녹았다. 긴 가뭄과 예측 불가능한 봄 날씨에 '조금 늦게 심으면 되겠지' 생각했었다. 그러나 때 이른 서리를 생각 못했다. 작년에 이어 이리 빠르게 서리가 내린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앞당겨 심어야겠다.
서리가 오기 전에 벼가 익은 논에 밀을 뿌렸다. 작년 일부 논과 밭에 앉은뱅이밀과 금강밀을 심어보았다. 얼추 감을 잡았으니 대뜸 가을 농사를 크게 저질렀다. 아버지께서는 한창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하던 시절, 더 많은 논에 밀을 심으셨었다고 했다.
어릴 적 기억에 농민회사무실 같은 곳에 가면 삼촌들이 슈퍼에는 없는 우리밀과자를 사주셨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아버지 영향으로 유치원에서 수제비가 나온 날, 우리밀 아니면 안 먹겠다고 아고똥하게 굴었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렇게 20년 전에는 이 논에서 밀이 자랐었다.
할머니는 그때 기억으로 밀농사는 ‘하면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 하신다. 밀의 수확 시기가 벼를 심는 시기와 겹치거나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해가 짧은 계곡 마을이라 조생종을 심어도 평야지보다 일찍 심고도 늦게 거두게 되는 곳이다. 할머니는 ‘밀을 심었던 땐 나락이 안되었다’며 ‘쓸데없는 일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나는 올해도 밀을 몰래 심었다. 작년엔 겨울 동안 물이 고이는 논은 거의 익지를 못했고, 밭에 심은 것은 모내기 전에 수확할 수 있었다. 조금 무리지만 ‘이르게 심으면 가능하겠다’ 싶었다.
올해는 13마지기 논에 밀을 뿌렸다. 빵을 만들기에 좋게 개량된 백강밀, 누룩을 만들고 밥밑용으로 쓰던 재래 앉은뱅이밀, 밀짚이 예쁘고 밥에 넣어 먹던 남도 참밀을 두루 뿌렸다. 벼들 사이로 논바닥에 떨어진 밀은 물을 뺐지만 촉촉한 논바닥에서 금세 싹을 틔웠다. 수확을 앞둔 논을 둘러보던 할머니는 다 익은 나락이 빠진 줄 알고 ‘뭣이 그렇게 훑어 먹었나’ 걱정하다 싹튼 밀을 보고 ‘내년 벼농사를 어쩌려고 하냐’며 한소리 하셨다.
콤바인이 수확하며 밀을 꾹 눌러 주었다. 볏짚으로 도톰하게 이불도 덮었다. 밀을 심고 나니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두근거렸다. 동시에 논에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더해주는 것도 없이 벼를 길러주었는데 ‘밀도 잘 부탁해’ 하고 덜컥 안긴 것 같았다. 햅쌀을 방아 찧고 나면 쌀겨며 왕겨며 아낌없이 돌려주어야겠다. 엎친 것 하나 없이 잘 자란 벼를 수확했지만, 밀은 조곤조곤 싹이 텄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00%의 자급률이 아닌데도 쌀은 늘 넘쳐나고 값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밀은 불과 2%도 안 되는 자급률을 가지고 여전히 엄청난 양을 소비한다. 다른 것을 팔기 위해 내어놓은 밥의 자리는 늘 불안하다.
가끔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의 먹을거리 주권이 뒤흔들리는데 사람들은 화면 너머를 보는 것 같다.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 농업이라는 한 산업에 국한된 이야기인가. 전쟁과 기후위기, 코로나의 여파로 식량 가격이 뛰고, 연결된 많은 것들의 가격이 오른다. 단순히 소비물가상승으로 볼 일인가. 오늘 내가 먹는 밥, 빵, 면, 술, 장을 비롯한 먹을거리들이 흔들리고 있는 일이다.
굶는 일, 대체할 식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나의 먹고사는 꼴, 생태가 긴밀하게 연결된 일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의 상실이다. 누군가는 수많은 위기가 겹쳐 와도 먹던 대로 먹고 살겠지만, 누군가는 더 어렵게 생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늘 위기는 약한 곳에 더 많이 아프게 온다. “할머니, 전쟁 나고 지구 아프고 해대서 밀이 없다니까?! 진안도 많이 따숴져서 마령이랑은 다 이모작 했데. 못자리 잘해서 심으면 되니 걱정하지 말어.”
호기롭게 말해두고 걱정 중이다. 술을 담으며 내내 누룩이 아쉬웠는데, 내년에는 농사지은 밀로 누룩을 띄워볼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