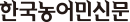배이슬·전북 진안
[한국농어민신문]

논에 물을 대면 메탄이 나오니 논농사를 줄이거나 물을 대지 않고 벼를 심는 것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는 얘기가 종종 등장한다. 우리나라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23%가 논에서 나온다고 한다. 메탄가스가 얼마나 나오는가도 중요하겠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논을 벼 생산 공간 정도로만 보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논은 벼를 바탕으로 온갖 생명이 사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숨 쉬는 공기를, 먹을 주식을 길러내고 온갖 수생식물과 곤충, 그들과 연결된 양서류와 동물들이 함께 먹고사는 공간이다. 볏짚이 썩으며 내뱉는 메탄이 얼마든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있는 것이다. ‘탄소탄소’ 하는데 정작 본질은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살리는 시스템의 복원이다. 헤프게 쓴 물과 흙, 공기에 대한 가치의 인지다.
당장에 논이 줄어들면 지역 내 지하수 함량이 줄고 수질 오염도 늘어난다.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이 이뤄지고, 물을 덜 대기 위해 벼를 심지 말라고들 하니 진안에서도 논에 조경수를 심는 곳이 늘었다.
논이 물을 가두는 동안 자연스레 흡수되던 물의 양이 줄고 더 깊이 더 큰 관정을 파야만 지하수를 쓸 수 있다. ‘비가 올 때는 몰아서 세게 오고, 안 올 때는 영 안 오고’를 반복하고 있다. 그 정도도 매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미 그 많던 둠벙도 없어졌고, 하천이란 하천은 수직으로 시멘트를 바른 마당에 논에까지 물을 가두지 않는다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이란 게 기껏 저수지와 댐 정도일 테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온전히 관리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량이 아직은 괜찮은 상태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어딘가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씨앗조차 심지 못하고, 그 결과 어딘가에서는 식량위기로 인한 내전이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삶의 근간인 물의 문제를 평균값을 내서 계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담수가 많아봤자 어딘가에서는 식수가 모자라는 마당에 정작 또 수출할 농산물 재배에는 물이 쓰인다. 다국적기업과 자본주의의 논리로 말이다.
우리의 삶을, 자아실현을 이상한 기준의 값으로 더하고 나눠 값을 매기는 것에 대해 나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꾸리고 먹고 살 수 있으려면 그 근간인 것들은 더 세밀히 쪼개고 쪼개 피부에 와 닿는 범위에서 들여다보고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닐까?
물을 가두는 논농사가 메탄을 엄청나게 쏟아낸다 치자. 그것이 과연 전기를 만들기 위해, 보내기 위해, 팔기 위해 돌리는 공장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보다 큰 것일까? 줄여야 한다면 환경적 부담이 더 큰 곳에서 먼저 줄여야 할 일이다.
논에 물을 대지 않고 벼를 재배하거나 식량작물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논은 물을 깊이 댈수록 풀과 싸우는 일을 덜 수 있다. 물론 마른논에 볍씨를 직접 뿌리거나 밭벼처럼 키우는 것, 혹은 겨울작물인 밀과 보리 사이 벼를 심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논농사를 짓든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하는 우리 삶의 방식을 전환해 나가지 않고, 생태계 연결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 온다.
기후위기시대 농업의 방향은 임시방편이 아닌 관점과 가치의 전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그렇게 급하면 효과도 크고 환경부담도 더 큰 다른 것부터 후딱 줄여야 할 것이지. 크게 봐야 할 것은 ‘좁게좁게’,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은 ‘얼렁뚱땅’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가뜩이나 물길이 다 끊긴 반쪽자리 논에 어렵사리 살고 있는 생명들을 내쫓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