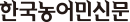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한국농어민신문]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농민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직업란 한 줄에 적히는 명칭이 그 사람을 담을 수도 드러낼 수도 없다. 농민이자 선생님이자 요리사이자 작가일 수 있고 단어 밖 문장으로 어떤 사람일지는 본인만이 정할 수 있다.
ㅣ 배이슬 전북 진안

농부에게 봄은 고양이 손 시즌이다. 고양이 손을 빌리고도 손이 모자라 종종거린다. 내 마음대로 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 철저히 작물의 시간, 밭의 시간을 쫓게 된다.
종종거리며 씨앗 넣는 9번째 봄. 농사짓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17살 나락을 베던 콤바인 위에서였다. 학교를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가겠다 했을 때 아버지는 흔쾌히 그러라 하셨다. 그렇게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가리를 타듯 물으셨다. 그때 가장 재밌어하는 일로 있어 보이게 “글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요”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직업 말고 어떻게 살고 싶냐고”하며 다시 물으셨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장래희망을 답해오던 와중에 아버지의 질문은 어색하고 힘겹기도 했다.
답을 찾되 밥값을 하라며 때때로 농사일을 시키셨다. 밥값으로 따라 나서 뒤에서 나락 자루를 잡다 호기롭게 콤바인을 몰았다. 물리적으로 힘이 센 아버지가 뒤에서 나락자루를 받고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이 나아 보였다. 절대 덜컹거리는 콤바인 뒤에서 먼지 뒤집어 써가며 탈곡통 차지 않게 바삐 자루를 뿔떡뿔떡 들이마시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서툰 솜씨로 해가 지는 논 위에서 나락을 베며 이렇게 사는 삶이 괜찮겠다는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난 날이었다. 그 후로는 조금씩 어떻게 살지, 어떤 농사를 짓고 싶은지 다듬고 실험해온 시간이었다.
이른바 업으로 이제 겨우 8번의 농사를 지어본 초보 농민이다. 지난 8년간 “농사지어요”하면 가장 많은 들은 말은 “무슨 농사지으세요?”가 1위, “농사 안 짓게 생겼어요”가 2위, “연 매출이 어떻게 돼요?”가 3위다.
첫 번째 “무슨 농사를 짓냐?”는 질문은 1~2가지 작물을 중심으로 규모화하는 상업농이 일반화된 지금에 농사는 배추 농사, 감자 농사 하고 나누기 때문이다. 벼를 비롯해 재래종, 개량종 할 것 없이 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들을 두루 심는 나로서는 아주 난해한 질문이다. “이것저것 쪼깨씩 지어요”가 최선의 답이다.
토마토가 그 작은 씨앗에서 뾰족하게 싹을 틔우고 옥수수가 가는 싹을 밀어 올리는 것이 언제 봐도 신기하고 아름답다. 분명 아침까지도 태도 안 나던 흙 위에서 ‘쩍!’하고 존재감을 내뿜는 호박새싹과 뒤집어 심으면 고개를 들지 못해 바둥거리는 작두콩은 또 얼마나 귀엽고 재밌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온갖 것들이 다르게 자라는 과정, 토마토 안에서도 가지작색인 그 꼴이 좋다. 그렇게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친구들을 섞어 심고 씨앗을 받고 매년 다시 씨앗을 넣는다. 하나하나가 심기는 양과 규모를 떠나 다 귀하고 예뻐 죽겠는데 “00농사요!”하고 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구구절절 설명하고 나면 “그렇게 지어선 안 남는다” 혹은 “그게 농사냐” 등의 핀잔을 듣기 일쑤다. 물론 나도 농사로 생계가 이어지고, 매년 농사지을 힘이 생기면 좋겠다. 단 그것이 꼭 정해진 방법, 규모, 형식이 아닌 나의 가치와 철학으로 농사짓고 싶다.
철없는 이야기라 할지 모르지만, 농사는 내게 자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이다. (직업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떤 일로 벌이를 하든 그것이 결국 나의 삶의 실현인 것을 떼어놓고 생각한다.) 00명의 농민이 있다면 00개의 농법이 있고, 00개의 농사 철학이 있다. 작물이 모두 다르듯, 한 명 한 명 농민의 삶이 그 삶에 담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르다.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아버지의 질문처럼 “무슨 농사를 짓냐”는 질문 전에 어떤 농사를 짓는지 물어봐주면 좋겠다.
두 번째 “농사 안 짓게 생겼어요”라는 말은 나이, 성별, 복장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젊은 여성 이라는 것이 농업이라는 직업군과 멀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지금껏 얼마나 성별로 가르고 나누어왔는지가 드러난다. 동시에 농업·농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도 함께 담겨있다. 긍정적이라기보다 힘들고 고된 노동의 부정적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농사짓게 생기려면 어떻게 생겼어야 하나’ 난감하다가도 우리가 우리사회가 경험한 농은 어떤 모습일까 씁쓸해졌다.
어떤 이들은 “대단해요. 멋지네요”라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대학 나와서 뭐 하는 짓인가”하기도 한다. 차이점은 농업농촌의 이해의 정도, 공통점은 농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낮게 잡혀 있는가 이다.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농민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직업란 한 줄에 적히는 명칭이 그 사람을 담을 수도 드러낼 수도 없다. 농민이자 선생님이자 요리사이자 작가일 수 있고 단어 밖 문장으로 어떤 사람일지는 본인만이 정할 수 있다. 머릿속 농민에 대한 이미지를 두고 어떤 모습의 농민이든 상상할 수 있다면 좋겠다. 까맣게 탄 피부에 고됨이 역력한 모습의 농민도 몸빼바지에 굽은 허리의 농민도 청바지에 빨간 장화를 신은 청년 농민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세 번째 “연매출은 얼마나 되요?”라는 질문은 “그런 실례되는 질문을!”하고 되받아 친다. 사실 “암시랑토 않게 못 벌어요”라고 해도 별거 아니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연봉이 얼마에요?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하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질문은 실례일 텐데 유독 청년농업인에게는 곧 잘 묻는다. 일부 언론에서 ‘농사가 괜찮은 직업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빌리는 것이 농업의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억대매출 청년농업인으로 소비된다. 그 청년농업인이 매출이 얼마든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농사짓는지 보다 “많이 번다더라 농사지어라”라고 이야기 한다. 조금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농사짓는다 하니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매출을 묻는다.
그런 또 다른 성공신화 같은 것을 기대한다.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연 100만원 이상 농업으로 수익이 있는지, 농지가 있는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등이다. 관리나 정책을 세우는데 기준으로야 그럴 수 있다지만 농이 가지는 수많은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치워두고 모든 방향이 경제만을 향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참 꿈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싶다가도 열심히 이야기 하고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작물이 다르고 다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안의 다름을 풍요롭게 즐기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도 왼갖 것 쪼깨씩 씨앗을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