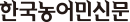[한국농어민신문]
살인적인 물가상승 중에도 쌀값은 2~3년 전을 회복하지 못했다. 애를 써서 잘 길러 수확량을 늘려 논다 한들 공급과잉이라는 쌀은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농부도 벼 농사를 꼼꼼하게 잘 지어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수확하고, 부족한 수입은 직불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경제적으로 환산해볼 때 더운 여름 논속에 들어가 피를 뽑느니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수입이 좋으니까 점차 기피하는 작업이 되어버린 것이다.
ㅣ김현희 청년농부·전북 순창

지난 토요일인 6월 21일은 절기상 하지였다. 하지는 보리와 밀이 마르고, 감자싹이 죽는 시기다. 지금처럼 수명이 길지 않았던 과거에는 ‘감자환갑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보리나 밀 등과 벼의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에서는 ‘하지 전 삼일, 후 삼일’까지는 모내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수확량이 팍 줄고, 서리 피해 등으로 미질이 확 떨어진다고 해 이모작 하는 논들은 지난주까지 정신없이 바빴다. 과거에는 하지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올해는 하지에 큰 비가 내렸다. 덕분에 감자 캐랴, 마늘 캐랴 밀 거두랴 다들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바빴지만 다 끝내놓고 맞이하는 비가 어찌나 반갑고 개운하던지.
6월 초에 모내기를 마친 내 논도 따로 물대기를 하느라 고생할 것 없이 물꼬만 적절한 높이로 잘 유지하면 되 마음이 편했다. 하지에 비도 오고 내 논에는 풍년새우가 바글바글하고, 올해는 풍년이 아닐 이유가 없다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다, 감자 캐고, 돼지 잡느라 정신이 없던 나는 하지 날 친한 언니네 하우스에서 토종콩 모종을 만들며 모처럼 잘 놀고 쉬었다, 그리고 이날 다른 곳에서는 ‘써레 시침’ 행사를 하기도 했다.
써레질은 모내기 전 물을 받아놓고 논의 흙을 부숴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다. 옛날에는 소가 써레를 끌었는데, 오늘날은 논 쟁기질과 써레질 모두 트렉터가 담당한다. 마른 논에 논쟁기를 달아 논을 갈고 나면 논에 물을 채워 로터리를 달아 흙을 잘게 부숴준다. 그럼 논에 자란 풀들도 흙과 섞여 잘 부숙되고 논도 부드럽고 평평 해진다. ‘써레 시침’은 써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에 씻어 말린다는 의미로 열리는 마을 행사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트렉터 시침’, ‘로터리 시침’ 정도 될텐데, 논 농사가 가장 중요했던 농촌에서 큰 일을 끝내놓고 한숨 돌리며 하는 행사라 의미가 깊다.
이제부터는 논물을 잘 대고 빼줘야 하고 피사리도 잘 해야한다. 5월에 빨리 심은 논들은 벌써 어느 정도 분얼을 마쳐 물떼기에 들어갔고, 옛날 절기에 맞춰 6월 초에 심은 내 논은 모 떼우기를 끝내고 이제는 물을 적당히 받아 모들이 잘 새끼치는 것을 지켜보며 풀 관리를 해줘야 한다. 올해는 5월까지 저녁 기온이 추운 날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논을 볼 때 평년에 비해 듬성듬성 모가 죽어있는 경우가 많아 보였다. 모 때우기를 하는 농부들도 많지만, 그냥 때우지 않아 비어있는 논들도 많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티가 나고 땜빵 같아보여 오가면서 계속 눈에 밟히곤 한다.
피사리 안한 논도 그렇다. 우렁이를 넣고 제초제를 몇 번에 나눠 뿌려도 자라나는 끈질긴 풀들은 있기 마련이다. 이는 사람이 들어가 뽑는 수 밖에 없다. 특히 써레질이 잘 안 되 평평하지 않은 논은 흙이 드러나면 그 자리는 우렁이가 먹을 수 없어 잡초들이 잘 자란다. 그런 논은 초장부터 들어가 풀을 잡아줘야 하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논 속에서 허리 굽혀가며 해야 하는 일이라 참 지치고 힘든 일이다.
2016년 처음 순창에 왔을 때만 해도 피사리는 논 일에서 큰일 중 하나였고 당연한 일이었다. 피가 크게 자라있는 논은 동네 창피한 일이자 어르신들의 안주거리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일까. 논에 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잡초가 나도 굳이 들어가 뽑지 않는 농부들이 많아졌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쌀이 귀하게 대접받지 못해서가 아닌가 싶다.
살인적인 물가상승 중에도 쌀값은 2~3년 전을 회복하지 못했다. 애를 써서 잘 길러 수확량을 늘려 놓는다 한들 공급과잉이라는 쌀은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농부도 벼 농사를 꼼꼼하게 잘 지어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수확하고, 부족한 수입은 직불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경제적으로 환산해볼 때 더운 여름 논속에 들어가 피를 뽑느니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수입이 좋으니까 점차 기피하는 작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규모화도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소농들이 사라지고 큰 단위로 농사를 짓게 되면 자잘하게 손이 가는 작업들은 챙기기 어렵다. 예전처럼 세심하게 논을 돌보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정도만 지어서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게 농업의 현주소다. 그래서 듬성듬성 모 떼우기가 안된 논들과 피가 나고 있는 논들을 보면 쌀이 받고 있는 홀대와 겹쳐져 슬픈 마음이 들곤 한다.
심고 거두는 대표적인 절기인 하지. 일 끝내고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풍성하고 든든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잠시고, 낮은 농산물 가격을 토로하고 꺾여버린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내 눈엔 가장 예쁜 감자가 공판에서는 애물단지가 되고, 모내기가 끝나기도 전에 쌀 수매 배정량을 확보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 부디 올해 추분 절기에는 수확하면서 유통 걱정과 가격 걱정을 내려놓고 든든한 마음이 되길 바래본다.